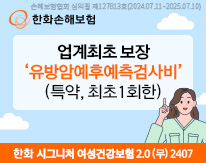|
|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해브투뉴스 |
# 지난 1월27일 허위 전입신고자 A씨는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세대주)·C씨의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B·C씨 실제 주소가 신고 돼 있었던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토록 도왔다. 이후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기존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키고 기존 거주지 건물에 임대인이 전입, 근저당을 설정토록 한 것을 확인했다. 또 전입신고 시 다른 지역에 있는 A씨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상 문제없이 전입신고가 정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위 사례처럼 임차인과 관련 없는 곳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범죄시도에 강력대응키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임차인과 무관한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시키고, 이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근저당을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만약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는 의심사례 발견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주민등록 업무를 소관하는 시 내 25개 자치구에 해당 사례를 알리고 정부에도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의 동의 없어 수집 및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 범죄시도로 판단했다. 실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살펴보면, ‘임대차는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다른 주소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시는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 시군구에 사례와 함께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전달하고 또 허위로 전입신고 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주소를 기존 주소지로 원복하고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신고 수리 시 신분 확인 방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범죄시도로 보고 있다”며 “시민들도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