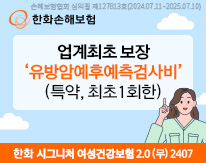필자 하루의 ‘하루수다’는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하루의 수다를 푸는 형식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특히 하루는 일본어로 ‘봄’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자 하루와 함께 일상생활의 수다를 풀어볼까 합니다. (편집자의 주)
“연말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드네”
 |
| 출처=해브투뉴스 |
직장 선배가 건넨 말 한마디에 “아, 맞네. 12월이네요”했다. 언제부터인지 12월이 와도 연말의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 인사동, 명동, 강남 어디를 가도 캐럴송은 들리지 않았다.
미디어 파사드로 장식된 모 백화점 외벽 LED만 화려하게 빛났다.코로나가 휩쓸고 간 겨울 풍경의 연장선일까? 경기침체의 그림자일까?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은 꺼지는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사람들은 꽁꽁 지갑을 닫고 외식을 줄였다.
소비가 줄면서 기업 실적도 바닥을 쳤다. 회사마다 비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열을 올렸다. 또 한번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사회 전반에 퍼졌다. 한 해를 결산하는 각종 TV프로그램만 새해가 온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자기들 잔치에 빠져 흥을 돋았다.
달랑 한 장 남겨진 달력. 송구영신을 말하기에도 ‘송구’할 정도다. 그런데 세밑 풍경이 휑한 것이 비단 코로나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어려워진 경제 때문일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팍팍한 세간살이가 사람들 표정에서 읽히지만 각자 연말의 분위기를 타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다. 움추린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거다. 연말 풍경을 즐길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세상에 자꾸 떠밀려 방향성을 잃고 자존감이 떨어져서다. 코로나에 고공 물가행진이 전부는 아닌데, 그것들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 위안거리를 찾지 못해서다.
생각해 보라. 어디 한 번 무탈한 해가 있었던가?
경기는 늘 안 좋았다고 했고, 나라 살림은 쪼들렸으며, 국회는 맨날 싸움터였다. 이런 난리통에 한 해를 견디고 다시 연말을 맞이했으니 우린 얼마나 기특한가 말이다. ‘가뿐히’ 한 해를 살아낸 스스로에게 위로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오지도 않은 걱정거리만 켜켜이 쌓고 있지는 않은가? 차분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가치를 곱씹어 보자.
어디에 있든 빛나는 자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바로 곁에 있음을 상기해 보자. 휘황찬란한 거리 풍경이 없어도, 복작복작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없어도 차분히 연말을 누려 볼 일이다.
“새해는 대동여지도의 봉수신호나 눈 쌓인 밤의 철길 위로 열차를 보내주는 수신호처럼, 다급하고도 아름다운 신호들이 당신들의 가슴에 도착하기를 바란다”
-김훈의 <밥벌이의 지겨움> 중에서.
[ⓒ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