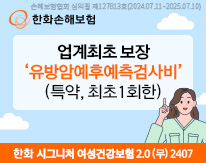|
| 사진=해브투뉴스 |
# 세입자 A씨는 집주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장기간 거주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세 상황이 좋지 않아 마땅한 다른 세입자도 없어 걱정만 앞서고 있다. 그런 와중에 A씨는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를 가야할 처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이처럼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하다가 전세금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질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경우 건물 점유나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에서 전세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전세보증금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뜻이다.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엄정숙 변호사의 이야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점유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점유란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전세금 반환소송은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16다244224 판결),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세입자는 소멸시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랜 기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두는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찾아야 세입자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